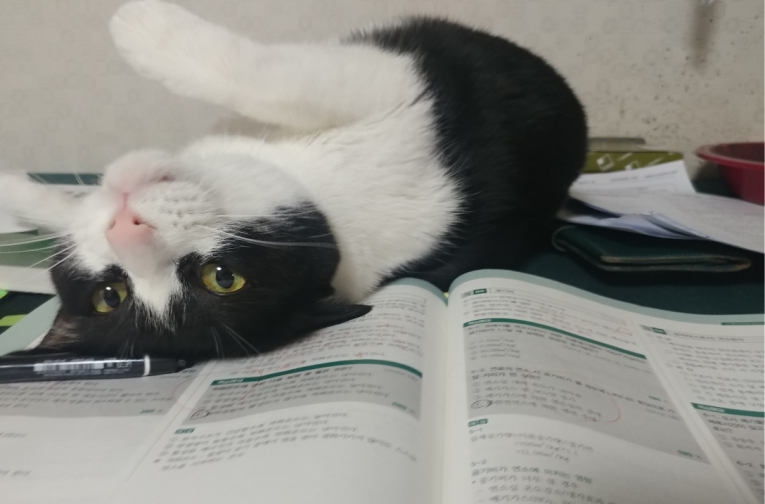양 이 는 양 이 양 이 해
양이와 아이들
양이는 딱 한 번 아기를 낳은 적이 있었다. 총 5마리로 4녀1남이었고, 다행히 별 탈 없이 모두 건강히 자라주어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보내졌다. 아무튼 우리 집이 가장 복작였던 시기를 꼽아보라면 양이의 아이들이 우리 집을 점거하고 있을 때였다. 주먹만한 아깽이들이 난동을 피우면 얼마나 난동을 피우겠냐 하겠지만 그들은 유례없는 망나니,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다.
첫째와 넷째는 젖소 고양이인 엄마와 터키시앙고라인 아빠 사이에서 어째서인지 카오스 무늬를 가지고 태어났다. 쌍둥이처럼 닮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두 녀석은 다섯 남매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컸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다. 뚠뚠한 생김새 때문에 못난이란 뜻의 사투리인 미구딴지에서 이름을 따와 각각 미구와 딴지로 불렸다. 미구딴지는 개냥이의 이데아 같은 애들이었다. 좋게 말하면 발랄했는데 나쁘게 말하면 정신없었다. 이빨이 생기자마자 양이의 밥을 몽땅 훔쳐먹었고 (덕분에 양이가 밥을 맨날 못 먹어서 따로 방으로 데려가 먹여야 할 정도였다) 청소기라도 돌리려 하면 청소기 위에 올라타고 놀았다. 다른 애들에 비해 덩치도 크고 눈도 작아서 작은 독만두같이 생긴 애들이었지만 나름 복스러운 생김새 때문에 엄마는 이 두 녀석을 제일 예뻐했었다.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대학 후배들에게 보내졌는데, 그곳에 가서도 왕 노릇을 했다고 전해들었다. 특히 딴지의 경우는 1키로도 안 나가던 주제에 후배네 집에 있던 말티즈 강아지를 가볍게 제압하고 강아지 집과 장난감을 모조리 차지해버렸다는 무용담을 남겼다.
셋째는 유일하게 남아로 태어난 고양이였다. 그리고 양이를 판박이로 닮은 외모로 태어났다. 남아선호주의였는지 아니면 자기와 유일하게 닮은 아가였는지여서는 모르겠지만, 양이가 유독 끔찍하게 챙기던 자식이었다. 그래서 버릇이 없었다. 고양이다운 도도 한 왕자님이었다. 셋째 고양이의 이름은 까망이였다. 까망이도 잘 자라서 친한 후배 집에 보내졌는데 대학을 졸업한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도도한 왕자님이었던 까망이는 왕이되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왕이다. 후배 왈, 심심하면 동네와 아파트 복도를 순찰하고 돌아오는데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귀여움과 간식을 하사받는다고 한다. 언젠가 가진 술자리 에서 후배는 까망이를 하도 오냐오냐해줬더니 기고만장 해져서 엄마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슬퍼했다. 후배가 슬퍼하건 말건 잘 지내고 있으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소심하고 겁 많던 아이었다. 성격으로만 따지자면 양이를 제일 많이 닮았다. 봉제 인형 사이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취미인 아기였기에 나는 둘째가 커서도 온실 속 화초같은 고양이로 자랄 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오판이었다. 둘째는 아빠가 다니던 직장 부하 직원에게 보내졌고, 미야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간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직원이 단기로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기는 바람에 미야는 우리 집에 일주일 정도 맡겨지게 되었다. 미야는 엄청 예뻐져 있었다. 어디 사료나 장난감 모델을 하는 고양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예쁜 고양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미야가 반가워서 아는 척을 했던 나는 화가 난 미야에게 얻어맞고 말았다. 내가 얻어맞는 모습을 본 양이가 달려와서 미야를 똑같이 때려줬고 둘 사이에 냉전이 흐르게 되었다. 사실 당시에는 아뿔싸 싶었었다. 1년이나 못 봤으면 남남이나 다름없을 텐데. 특히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두 녀석이 저러다 피라도 볼까봐 전전긍긍했었다. 하지만 그건 내 기우였다. 만난 지 하루 만에 두 녀석은 모녀의 정을 되찾았다. 나중에는 둘이 너무 잘 지내서 헤어지고 나서 서로를 찾을까봐 걱정을 할 정도였다.
막내는 유달리 내 기억에 많이 남는 아이다. 막내는 다른 애들에 비해 작게 태어났었다. 양이가 아기를 낳다가 너무 지친 탓에 막내의 태막도 떼어주지 못해 내가 태막을 벗겨주고 탯줄까지 잘라줬었다. 막 태어났을 당시에는 숨도 쉬지 않고 있어서 인공호흡까지 해줬었다. 간신히 숨은 쉬기 시작했지만 영 움직이지를 못해서 모두가 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예상은 기분 좋게 깨졌다. 막내는 힘과 체력이 부족했지만 깡이 남달랐다. 양이의 젖을 빨러 기어가지도 못하길래 직접 들어다 젖을 물려줬는데 막내는 거기서 신세계를 느낀 듯했다. 언니 오빠들이 막내가 물고 있는 젖을 뺏으러 할 때마다 막내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작은 발을 마구 휘저어댔다. 눈을 뜨는 법보다 고양이 펀치를 날리는 법을 먼저 배운 것이다. 제일 작게 태어나서 걱정했는데, 걱정 말곤 별달리 해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내는 악으로 자라 났다.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땐 밥도 와구와구 먹었고, 장난감을 던져주면 누구보다도 열중해서 사냥을 했다. 막내 도 아빠의 부하 직원 집에 보내졌는데, 손가락만 하던 작은 애가 이제 호박만 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사람의 무릎 위이고, 꼭 사람 옆에서 붙어 자려 해서 예쁨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내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고마울 따름이다.
CREDIT
글·사진 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