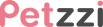SHELTER
묘리네 쉼터
2018년 1월에 <묘리네 쉼터>라는 이름의 작고 어린 쉼터 하나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바람이나 기대, 추억, 의미. 그래서 <묘리네 쉼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묘리’란 이름의 특별한 고양이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고양이 묘(描)와 이익 이(利)를 합쳐 조어를 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묘한 이치라는 뜻의 묘리(妙理)를 이름으로 쓴 것일까?

고양이의 이익을 위해 묘한 이치로 돌아가는 곳
생각은 여러 갈래로 가지를 치지만, 답은 아주 간단할 때가 많다. ‘묘리’ 역시 쉼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 그저 운영자인 최경희씨처럼 서대문구 TNR 자원봉사를 하는 분 중에 <묘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쉼터를 하려면 인터넷카페가 필요해서 카페 이름을 쉼터 이름으로 받아 쓰고 쉼터의 소식도 카페를 통해 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직접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묘리네 쉼터>의 ‘묘리’는 描利도 妙理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묘한 이치로 돌아가는 고양이의 이익을 위한 곳’임도 알게 되었다. 이 묘한 공간의 운영자는 9년 차 캣맘 최경희 씨다. 캣맘으로는 잔뼈가 굵어서, TNR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동분서주해왔고, 2017년에는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으로서 동물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1년 내내 구조와 치료 후 입양을 반복하는데 평균 40여 마리의 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경희 씨에게도 쉼터 일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벅차다.

하지만 ‘어쩌다 쉼터같이 어려운 일을 하게 되셨어요?’라고 경희 씨에게 물을 수는 없었다. 쉼터에 들어서서 3개의 방에 흩어진 고양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5마리의 고양이가 3개의 다리로 뛰어다니거나 우아하게 눕거나 부드럽게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때로는 깡충거리며 화장실에 들어가서 놀랍도록 평범하고 격렬하게 모래를 덮었다. 보호받고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보통의 고양이일 수 있지만, 길 위에서는 고양이로 오래 남지 못할 아이들이었다.
몇몇 고양이는 꼬리가 밥테일 종처럼 짤막하고 동그랬다. 감전 사고로 그렇게 된 아이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으깨져서 괴사가 진행되었던 아이까지 다양한 사연이 그 짧고 복슬복슬한 꼬리에 담겨 있었다. 만약 구조하지 않았다면 괴사가 꼬리를 타고 몸통까지 번졌을 것이다. 그러니 쉼터를 어쩌다 하게 되었느냐고, 왜 이 어려운 일을 시작했느냐고 어찌 물을 수 있었겠는가.

“밥을 주니까 고양이가 꾀는 거 아니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듣게 되는 말이 있다. 밥을 주니까 고양이가 더 생긴다는 말. 캣맘 때문에 고양이가 더 많이 꼬인다는 말. 경희 씨 역시 자주 들었던 그 말이 사라지는 데는 4년이 걸렸다고 한다. TNR을 하고 4년, 이제 그 동네의 주민들은 이상하다는 듯 고양이가 안 보인다고 수군거린다. 많은 캣맘처럼 경희 씨 역시 TNR을 죽기 살기로 했다. 경희 씨는 모든 길고양이를 다 집고양이로 만들자는 사람이 아니다. 길고양이는 길고양이의 삶이 있고, 모두 실내로 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그런 삶을 견디지 못하는 고양이도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TNR에 더 열성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TNR이 동물학대라고까지 말하고, 자연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라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들이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시멘트와 콘크리트 더미의 ‘자연’ 속 길고양이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 도태되고 적정 개체 수만 남게 되니 TNR을 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도태 과정이 너무 아프고 처참할 수도 있기에, 또 중성화 안 된 개체 간 영역 다툼과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한 고양이 학대가 걱정되었기에 경희 씨는 그럴 수가 없었다.
캣맘과 쉼터는 하나
캣맘을 하면서 구조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곯고 있는 고양이가 보여서 밥을 주기 시작했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가자꾸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고양이 돌봄과 쉼터는 하나의 몸처럼 이어져 있다. 누군가는 따로 쉼터를 만들고, 누군가는 가정 내쉼터를 만들어 구조와 치료, 임보, 입양의 길을 갈 뿐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구조 시스템은 ‘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구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원 현장에서 민원 대상인 동물을 이동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구조된 동물을 치료하거나 돌봐서 새로운 가정으로 보내려는 시도는 미미하다. 또한 구조된 동물이 집결되는 보호소의 규모가 크다 보니 소음과 악취, 부지 비용 문제 등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게 되고, 사람과의 접점이 적어 반려동물이 될 기회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경희 씨는 그런 현재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일정 시간 보관했다가 안락사하는 것이 아닌, 치료하고 돌봐서 사람의 곁으로 돌려보내는 데 세금을 썼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묘리네 쉼터>는 캣맘이나 활동가가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가 그렇듯 도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혹시라도 위치가 노출되어 쉼터 유기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아 보였다. 그런 까닭에 외부인의 쉼터 방문 봉사는 받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없다 했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응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다.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입양처.

후원자도 봉사자도 거의 없는, 운영자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1마리의 유기 사례도 너무 큰 짐이 될 이 작은 쉼터에 사람의손길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사람과 가까운 그곳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였다. 1마리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해주고 싶어서. 그것이 아마 경희 씨를 비롯한 캣맘과 쉼터 운영을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오로지 고양이를 위하여.
*<묘리네 쉼터>에 관심이 있다면 (http://cafe.naver.com/westerncat)
CREDIT
글 김바다 |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자
사진 김바다, 묘리네쉼터?
에디터 김지연
본 기사는 <매거진C>에 게재되었습니다.
콘텐츠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