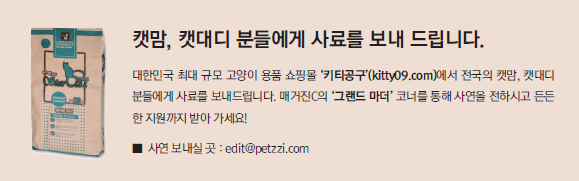GRAND MOTHER
어쩌면 마지막 식사일지 모르는
길 위의 고양이들을 위해
길고양이들의 모습에서 그 마을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경기도 일산의 캣맘 삼분 씨의 뒤를 따르며 만난 마을의 고양이들은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집고양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건강하고 말끔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건축 이전에 살던 생명은
삼분 씨와의 첫 화제는 최근 보도되어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한 ‘일산 PC방 고양이 학대 사건’이었다.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다. 삼분 씨는 학대자를 향해, 미약한 처벌체계에 대해 거친 말을 쏘았다. 일면 이해가 되었으나, 한편으론 저 뜨거움이 어디서 왔는지 의아했다. 궁금증이 풀리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삼분 씨는 이 아파트 단지의 세 번째 입주자다. 일산이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부상할 때였다. 현대식으로 쌓아 올린 근사한 아파트에 저마다의 꿈을 갖고 몰려든 사람들. 그 틈에서 삼분 씨는 쓰레기봉투를 뜯는 볼품없는 고양이를 봤다. 이 아이는 아마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여기에 살던 원주민일 것이다. 직감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청운의 꿈을 갖고 새 집을 마련한 사람들에게 쓰레기나 헤치는 고양이들이 얼마나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될지.
봉투를 뜯던 고양이를 쫓아간 자리엔 새끼 고양이가 몇 마리 있었다. 삼분 씨는 얼른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가져줬는데, 사람 밥에 통조림 참치를 섞은 ‘개밥’이었다. 그때는 시판되는 고양이 사료가 거의 없었고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그래도 고양이들은 야무지게 먹어치웠다. 밥그릇 안에 들어갈 기세로 허겁지겁 먹는 새끼들과 그 옆을 내내 지켜보다 빈 그릇을 핥는 어미 고양이의 모습을 보며 삼분 씨의 마음은 미어졌다. 그 날을 계기로 삼분 씨는 동네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 그땐 분명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끈끈한 편견과 혐오를 차차 목도하게 될 줄 몰랐을 것이다.

밥만 줄 순 없더라
현재는 과거의 결과다. 그러니 삼분 씨가 여러 해 동안 겪은 논쟁과 다툼의 역사를 적기보다, 지금 동네의 상황을 살펴보자. 삼분 씨는 서른 개 정도의 밥자리를 돌며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분할해 한쪽은 다른 캣맘에게 맡기고 자택 주변 밥자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가끔 근처 단골식당과 조금 떨어진 야산에도 올라 고양이들의 식사와 보금자리를 살펴 준다.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었는데, 밥그릇에 사료 쏟는 소리만 나도 어딘가에 은신해 있던 녀석들이 고개를 내밀고 반가움을 표한다. 야산의 밥그릇엔 4kg 사료 포대를 통째로 붓고 와야 할 만큼 식구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고양이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번식력이라는 것을, 모든 캣맘들은 알고 있다. 삼분 씨가 관리하는 거의 모든 아이들의 귀는 조심스레 커팅이 되어 있다. 이는 중성화 수술(TNR)의 상징이다. 사정을 모르는 눈으로 보니 가끔 나타나는 아기 길고양이의 뒷모습이 귀엽기만 했는데 삼분 씨는 “그렇게 신경 썼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라며 결이 다른 말을 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에겐 적당한 밥자리를 마련해주고, 발정이 와 밤낮 우는 고양이는 중성화를 시켜주면 되지만, 이미 태어나 고양이 집단을 불려버린 고양이들은 어찌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고양이를 보는 시선이 고와지고, 오랜 설득으로 해코지하는 주민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래도 길에서 태어난 아기 고양이의 운명은 꽃길보단 가시밭길이다. 사람과 고양이의 합리적인 공존, 이미 있는 고양이들의 부족함 없는 삶을 위해 삼분 씨는 중성화를 통한 개체 수 유지에 세심히 신경 쓰고 있다.
‘현재’를 하나 더 말하자면, 삼분 씨는 경비 아저씨들에게 가끔 커피를 돌린다. 단지 내 입김이 센 사람들에겐 가끔 봉투도 보낸다는 은밀한 말도 전했다. 이웃 1층 집 베란다 밑에, 어린이집 계단 아래, 경비실 화장실 옆에 마련된 고양이 밥자리는 지난한 설득과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차라리 유상 임대한 한 줌의 부지였다. 그럼에도 밥자리를 치우란 원성과 그렇게 좋으면 집에 데려가 키우라는 몰상식한 항의는 여전하며 아침마다 목조 급식소는 파손된 채 발견된다. 아무리 때우고 막아도 물이 새는 댐처럼, 완전한 공존은 닿을 듯 닿지 않는 아득한 꿈일지도 모른다.
시작은 미미했고, 끝은 보이지 않지만
“밥을 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력이 되고 건강하지만 혹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밥을 기다리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밥을 주면서도 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삼분 씨는 사료에 몰려드는 아이들마다 이름을 알려주며 그들의 삶을 소개했다. 밥을 처음 줄 때는 몰랐을 것이다. 이토록 깊숙이 아이들의 삶에 관여하게 될 줄은. 그러나 그것은 필연에 가깝다. 다시 적자면, 밥에 가까이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환경의 척박함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굶주린 생명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추위에 떠는, 병에 걸린, 학대를 받는 생명도 지나치지 못한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이곳은 방문한 10월에도 벌써 낙엽이 많이 져 있었다. 조금 더 빨리 찾아온 냉기. 캣맘들은 도저히 밥만 줄 순 없다. 부서진 급식소를 손 보고 거처에 담요나 스티로폼을 넣어줄 때다. 아파트 지하 공동 보일러와 연결된 대형 환풍구 앞은 훈풍이 뿜어져 나와 밤마다 아이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동시에 소음과 용변, 주민들의 혐오 어린 시선도 집중되기에 밥을 주지 않는 날에도 둘러보러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삼분 씨의 몸과 마음은 더 바빠질 것이다. 고된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그가 잃지 않으려는 게 있다. “오늘 주는 이 밥이 마지막 밥이 될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즐거운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민한 길고양이들은 밥을 먹을 때 비로소 사람을 가까이서 본다.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가장 많이 입력하는 때가 이 순간이다. 비단 고양이를 하찮게 보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표정이 아니라, 캣맘을 통해 사람을 배우는 고양이를 위해서 삼분 씨는 웃는 얼굴을 견지해 오고 있다.
삼분 씨가 이 마을에 온 지 20년. 다 적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고양이들은 사람을 보고 도망가지 않는다.
CREDIT
에디터 김기웅
본 기사는 <매거진C>에 게재되었습니다.
콘텐츠의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